[책 감상/책 추천] 유리관, <교정의 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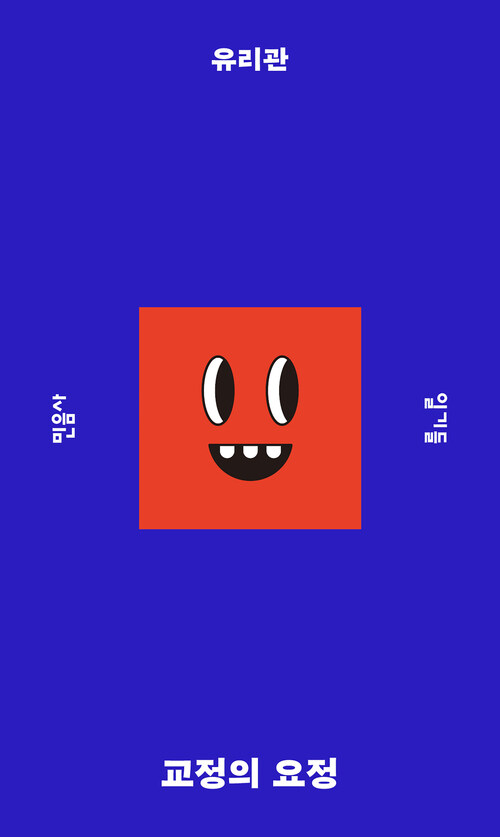
이 책을 읽으며 생각했다. “아니, 이분 화가 많으시네….” 그도 그럴 것이, 저자가 교정공이기 때문이다. ‘-던’(과거)과 ‘-든’(선택), ‘-로써(수단)’과 ‘-로서(자격)’ 등을 구분하지 못하고 틀리게 써 놓은 글을 고치고 있다 보면, (저자 말대로) ‘끼새수교(’교수새끼’를 뒤집은 것)’들 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나도 교정 일을 해 봐서 아는데, 틀리는 사람은 만날 똑같은 부분을 똑같이 틀린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지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그걸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이제는 희미해졌습니다. 교정공이라는 직업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늘방석의 바늘들처럼 꽂힌 채 일터로 집으로 실려 가는 출퇴근길 나는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인류 역사상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으로든 최대의 읽고 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 아닐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는 바로 그래서일지, 나 교정공의 일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
이 직업에는 내버리기 어려운 특유의 병과 벌도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내 노동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그 어떤 잘나고 목소리 높으신 분들의 그 어떤 글에서든 고칠 곳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말글을 쓰는 이 나라에서 손발로 의전서열이 꼽히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지성의 첨단에 계시다 하는 박사 교수님들, 심지어는 저 훌륭 대단한 여러 작가 문호님들까지.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일에 오직 내가, 폭포 아래서 폭포를 멈추려 하고 있다는 그 느낌, 오직 나만이, 혼자서만 유령들을 보는 듯한, 그 위험천만한 느낌에 붙들릴 때마다 나는 눈을 감아 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의 기로 앞에서, 속으로 눈물을 쏟고 분을 토했을, 이제 교정의 전당에 들어가 표정 없이 늘어선 선배 교정공들의 모르는 얼굴(데스마스크)들을 나는 떠올립니다. 선배들의 단단한 이마 너머에 무른 것의 고통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한없는 고통과 노고가 있었음을 나는 느낍니다. 이 고통은 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이 고통이 끝나는 것이 온당할까요?나의 선생님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이들을 가장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그런 이들을요. 다른 누구보다도요. 거의 모든 게 위기에 빠져 있고 한국어 역시 그렇습니다. 내 결론은 이겁니다. 교정공의 눈으로 본 말글세계가 지옥이라면 교정공은 악마가 되는 수밖에는 없다, 아니면 여러분을 악마로 만드는 수밖에…… 농담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나로 대체하려는, 나 교정공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1부의 제일 첫 번째 꼭지는 ‘피와 해골 신도’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딱 이것뿐이다.
복수할 것이다. 교정의 제단에 교정된 피와 해골을 바칠 것이다. 시발…… 복수한다…….
내가 교정교열 일과 관련해 제일 공감하는 표현은 이것이다.
교정교열자의 업무는 지옥에서의 밭 갈기와 같은 것이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을, 전혀 가능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감히 가능하게 하려고, 무한한 책임 영원한 책임으로 홀로 떠맡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우리 사회에는 영어 같은 외국어 공부보다 한국어 공부가 경시되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맞춤법을 지킨다고 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맞춤법을 너무 꼬박꼬박 지켜서 글을 쓰는 사람은 일부러 피한다는 글도 인터넷에서 봤다. 하지만 규칙을 중요시하는 나는 맞춤법도 일종의 규칙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 장소에서의 예절(예컨대 버스나 지하철 좌석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않는 것)을 지키듯 맞춤법도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 맞춤법을 지키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한 그런 예절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닌가?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낀다.) 다른 사람들은 맞춤법을 우리(국어 교사, 국어 전공자, 편집자, 교정공 등)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실생활이나 인터넷 등 맞춤법이 틀린 글들이 많은데 그걸 보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나만 집착하는 건가’ 싶어 시무룩해지곤 한다. 위에 인용한 저자의 표현이 내 마음을 정말 잘 표현했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교정 일을 하면서 나를 버티게 해 준 건, 그래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 하나뿐이었다. 다른 사람은 이게 틀려도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까, 아는 한은 그걸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말 아무도 몰라 주는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그 기분… 교정교열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2부는 저자가 책을 읽은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그 문학 작품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두루뭉술한, 개인적인 감상의 비중이 더 크고, 3부는 ‘교정공기’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기에 가깝다. 개인적으로 1부가 ‘교정의 요정’이라는 제목과 제일 가깝고 제일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만하다. 나머지 부분은 소위 (저자 표현대로) ‘좌파’ 이야기가 종종 있어서 불편해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모두가 받아들이기에는 껄끄러운 주제도 있다. 하지만 1부는 교정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우와, 이 사람 화가 많네!’ 하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이 책을 전부는 아니라도 1부만큼은 읽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정 일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기술적으로나 신체적이라기보단, 정신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다들 알아 주셨으면…
'책을 읽고 나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 감상/책 추천] Sierra Greer, <Annie Bot> (21) | 2024.10.09 |
|---|---|
| [책 감상/책 추천] 개브리얼 제빈, <비바, 제인> (9) | 2024.10.07 |
| [월말 결산] 2024년 9월에 읽은 책 (11) | 2024.10.02 |
| [책 감상/책 추천] 조너선 갓셜, <이야기를 횡단하는 호모 픽투스의 모험> (22) | 2024.09.27 |
| [책 감상/책 추천] 박신영, <역사 즐기는 법> (19) | 2024.09.23 |
| [책 감상/책 추천] Hannah Nicole Maehrer, <Assistant to the Villain> (3) | 2024.09.18 |
| [책 감상/책 추천] 올리비아 얄롭, <인플루언서 탐구> (14) | 2024.09.16 |
| [책 감상/책 추천] 할란 엘리슨, <나는 입이 없다 그리고 비명을 질러야 한다> (3) | 2024.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