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감상/책 추천] 이빈, <자두맛 캔디>

내 동년배들은 다 알고 다 읽어 봤을 <안녕 자두야>의 작가 이빈의 에세이. 내 유년 시절의 한 구석을 차지하는 이 만화는 2010년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다. 이 애니메이션의 클립 영상은 또한 유행하는 밈을 한껏 섞은 재치 있는 제목으로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아래 드립을 보여 드리고 싶어서 굳이 캡처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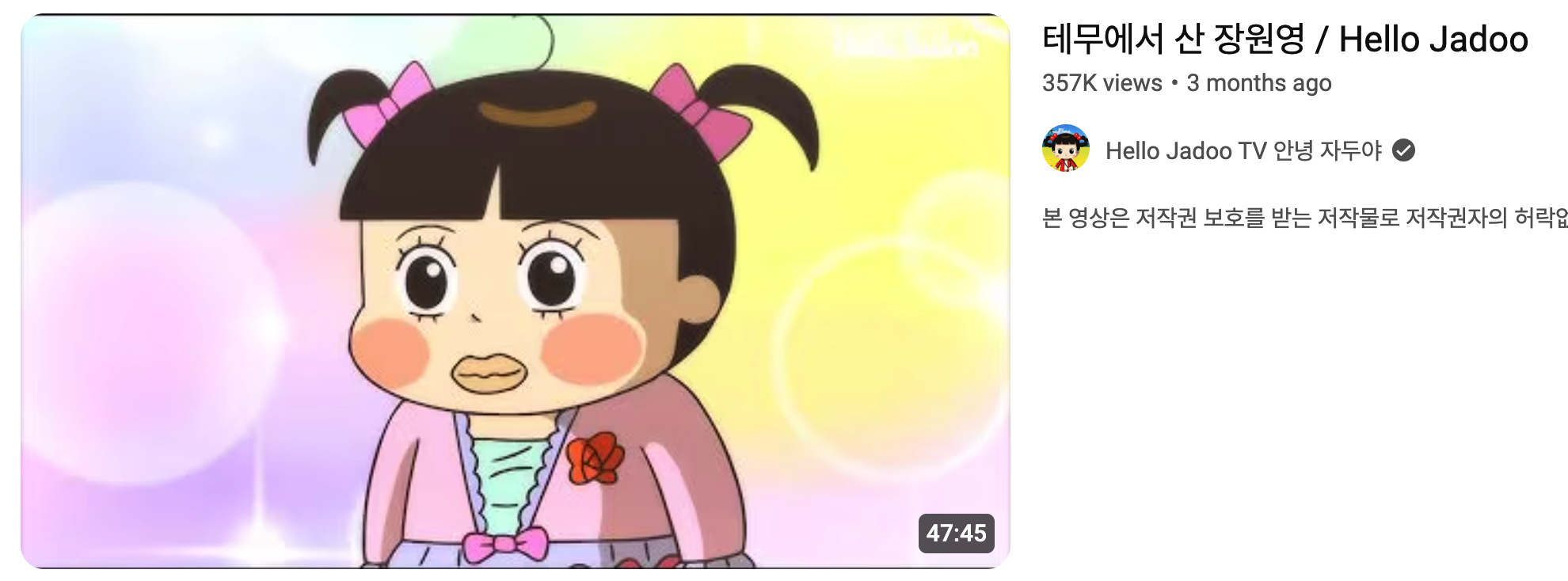
비록 나는 <안녕 자두야>의 결말도 가물가물하고(내가 이걸 끝까지 봤던가?), 애니메이션도 본 적 없지만(애니메이션판에서 자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 <안녕 자두야>라는 만화와 작가 이빈의 이름은 내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러던 중, 리디 셀렉트에 이게 올라왔기에 향수에 어린 기분으로 읽기 시작했다(참고로 밀리의 서재에도 올라와 있다). 덕분에 오랜만에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사실 <안녕 자두야> 만화 자체는 내가 어릴 적에 읽은 것이지만, 이빈 작가는 나보다 한 세대 위이다. 이빈 작가의 어머니가 남자애인 막냇동생을 편애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어릴 적에 내가 만화를 보면서도 그렇게 느꼈는데, <안녕 자두야> 이야기가 나오면 이 편애 이야기가 안 나오는 법이 없더라. 아마 많은 독자들도 그걸 보고 공감했기 때문이겠지. 어머님 본인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자라셨다는데 왜 본인도 또 똑같은 차별을 반복하셨을까… 이 에세이에도 어머니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 어머니가 동네 아줌마들과 태몽을 이야기하길래 자기 태몽은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단다. 어머니의 대답과 그 아래의 몇 문단까지 더 인용해 본다.
그러자 엄마가 말했다. “계집애가 태몽이 어딨어?”라고. 그 말이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계집애가 태몽이 어딨어’라니? 그럼 태몽은 아들만 꾼단 말인가? 내가 어렸던 1980년대에는 지독한 남아 선호 사상이 남아있었다. 삼대독자였던 막냇동생이 태어나자마자 그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새삼스럽진 않았다. 그런데 여자애는 태몽도 없을 줄은 몰랐다.
엄마도 외할머니에게 엄청나게 차별을 받고 자랐다. 나는 어렸지만 눈치가 빠른 아이여서 그걸 모를 수가 없었다. 외할머니 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엄마나 이모를 대할 때와 외삼촌을 대할 때의 태도가 천지 차이인 게 눈에 보였다. 외할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뭐든지 크고 맛있는 건 외삼촌 앞에 놓였다. 외삼촌이 뭐라고 툴툴거려도 외할머니는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외삼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엄마는 그것과 똑같은 눈으로 막냇동생을 보고 있었으니 그걸 모를 리가 없었다.
이해가 가지 않았다. 본인이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자랐으면 자기 자식들한테는 안 그러지 않나? 나라면 그럴 텐데…. 엄마는 외할머니보다 심하진 않지만 아들인 막냇동생을 무한대로 사랑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그 이유로 엄마에게 대들며 많이도 싸웠다. 이해가 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더 똑똑하고 공부도 더 잘하고 아무튼 뭐든지 잘하는데 엄마는 왜 막냇동생을 더 사랑할까? 왜 우리는 세뱃돈을 천 원씩 받는데 막냇동생은 오천 원을 받을까?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돈 쓸 곳도 많을 텐데 나에게 제일 많이 줘야 하지 않나? 나이가 든 후에는 엄마에게 그 이유를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다.
“엄마, 엄마는 왜 우리를 차별하고 키웠어?” 엄마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며 대노한 것은 불 보듯 뻔했다. 우리 엄마는 자신이 불리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화를 냈다. 나는 굴하지 않고 집요하게 몇 년에 한 번씩 이 질문을 계속했다. 그러자 드디어 엄마는 대답 같은 걸 내놨다. “너도 나중에 시집가서 애 낳아봐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나도 알게 되는 걸까? 그럼 나도 엄마처럼 딸과 아들을 차별하게 되는 걸까? 그렇게 차별했던 엄마를 이해하지 못 했으면서? 어쨌든 나는 아이를 하나만 낳았으니 엄마가 말한 걸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
그건 그렇고, 이빈 작가의 필명 ‘이빈’이 친구와의 약속인 거 아셨는지?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둘은 “쌍둥이처럼 잘 맞았고 너무나 잘 통했다”. 저자의 비유처럼 앤과 다이애나의 교환일기처럼 둘은 교환만화도 그렸다.
우리는 같은 중학교에 입학했다. 아쉽게도 중학생이 되어서 같은 반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영원한 절친이었고 항상 같이 하교했다. 우리 집은 작고 별로였지만 그 애의 집은 넓은 주택이라 주로 거기에서 놀았다. 때론 함께 자고 공부도 했다. 만화 노트도 계속 이어서 그렸고 공동 필명도 지었다. ‘이빈’이라고. 그때는 그 이름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다. 만약 우리가 커서 어른이 되어 연락이 끊어지더라도 누구든지 먼저 만화가가 되는 사람이 이 필명을 사용하자고 약속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이름을 보고 찾아가는 거지.” 너무나 로맨틱한 기분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친구는 중학생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만화를 그리지 않았지만, 이빈 작가는 프로 만화가를 꿈꾸고 동인지도 그려서 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전학을 갔다. 연락을 자주 주고받자고 약속했지만 연락은 점점 드물어지다가 끊겼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인연이 아니다. 작가는 공모전에 입상해 프로 만화가로 데뷔했다. 정말로 그 친구와의 약속대로 ‘이빈’이라는 필명으로.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와 지하에 있는 내 방으로 내려가려는데 우편함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무명 만화가인 내게 팬레터 같은 게 올 리가 없었다. ‘도대체 누구지?’ 하며 펼친 편지엔 이렇게 쓰여있었다. ‘난 네가 반드시 만화가가 될 줄 알았어.’ 그 애였다. 내가 가끔 단편을 출간하던 출판사에 연락해 주소를 물어본 모양이었다. 그날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제일 많이 울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다. 만화가로 데뷔하면 필명으로 쓰자던 ‘이빈’이란 이름을 보고 그 애가 나를 찾아냈다.
그 뒤로 우린 가끔씩 연락하며 지낸다. 그 애는 나보다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도 일찍 낳았다. 학교에서도 그렇게나 인기가 많았는데 역시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는 건가. 하루는 그 애의 딸아이에게 물어봤다. “너희 엄마도 만화 그렸었는데 알고 있어?” 그 애의 딸아이는 나에게 사인을 받던 참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금시초문이란 듯 눈이 동그래졌다. “우리 엄마가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나는 그 애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네 엄마가 옛날엔 나보다 훨씬 잘 그렸어. 네 엄마랑 둘이서 매일매일 같이 만화 그렸어. 너무 재미있고 좋았어, 그때….” 지금 그 애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 요샌 가끔씩 풍경화도 그리더라. 주로 그리는 배경은 우리가 살던 옛날 그 동네이고.
누구나 삶에서 드라마 뺨치는 일이 하나씩은 있다지만 이건 진짜 너무 멋지지 않나요! 짝짜꿍이 잘 맞던 친구랑 공동 필명으로 데뷔하자는 약속을 한 거나, 한쪽은 만화를 접었지만 이쪽 작가는 진짜로 계속 노력해서 필명으로 데뷔한 거나, 그렇게 데뷔한 친구를 어찌어찌 찾아내서 다시 연락한 거나, 어디 하나 감동적이지 않은 부분이 없다. 나 울어… 😭
이 외에도 <안녕 자두야> 속 캐릭터들의 모델이 된 몇몇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나 작가 본인 어릴 적 추억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빈 작가는 벌써 성인 아들을 둔 50대 중년이 되었지만, 이 에세이에는 남편이나 아들 얘기가 많이 없는 것(물론 조금 언급되긴 한다)도 솔직히 마음에 든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이빈 작가님이지 남편분이나 아드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튼 나와 같은 동년배로서 향수에 빠지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이빈 작가님 앞으로도 많이 활동해 주시길 😘
'책을 읽고 나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 감상/책 추천] 캐시 오닐, <셰임 머신> (3) | 2025.01.06 |
|---|---|
| [연말 결산] 내가 뽑은 2024년 올해의 책 (19) | 2025.01.03 |
| [월말 결산] 2024년 12월에 읽은 책 (10) | 2025.01.01 |
| [책 감상/책 추천] 전성진, <베를린에는 육개장이 없어서> (35) | 2024.12.25 |
| [책 감상/책 추천] 정유리, <날것 그대로의 섭식장애> (31) | 2024.12.18 |
| [책 감상/책 추천] 박서련, <마르타의 일> (34) | 2024.12.13 |
| [책 감상/책 추천] 황유미, <독립어른 연습> (45) | 2024.12.11 |
| [책 감상/책 추천] 김해인, <펀치: 어떤 만화 편집자 이야기> (43) | 2024.12.09 |



